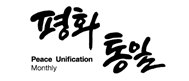통일칼럼
예기치 않은
칼 슈미트의 DMZ 방문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으로 시작된 북한의 남북합의 파기 행동은 분노보다는 슬픔을 자아낸다. 다시 남북합의가 휴지조각이 되고, 남북관계는 대결과 대화를 반복하는 쳇바퀴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체념이 그 뒤를 따른다.
평창에서 시작해 판문점, 평양을 거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함께 상상하고 실천을 시작한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DMZ가 전쟁 가능성을 완충하고 평화를 확산하는 진원이 되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것인가. 전쟁도 평화도 아닌 한반도는 어디로 가는가? 칼 슈미트(Carl Schmitt)는 한반도를 보고 총력전으로 갈 것이라고 말할까?
슈미트는 나치시대와 냉전시대를 산 독일의 정치·법학자이다. 나치에 부역했지만 그의 주권이론은 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고 패전국 독일에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고 경제배상을 요구한 베르사유체제를 “전쟁과 평화의 중간 상태”라 말했다. 그는 “베르사유체제는 전후 일관되게 현실의 전쟁을 법학적 픽션을 통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그런 중간상태는 제재, 선전, 고립 등과 같은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적대관계를 지속함으로써 “군사충돌보다 더 가혹한 총력전”, 혹은 “적대의 전면화”이기 때문이다.
남북은 이제 다 같이 서로를 비방하는 전단을 살포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노력을 부정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슈미트는 베르사유체제가 이미 시작된 “상태로써의 전쟁”을 법적으로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의 중간상태론을 판문점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에 적용할 경우 그것은 총력전을 은폐한 신사협정인가, 전쟁에서 평화로의 전환점인가.
슈미트는 중간상태에 대해 모순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것을 “무규정적이고 의도적으로 미확정적”이라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면서, 전쟁 아닌 전쟁으로 보기도 했다. 슈미트는 중간상태가 의미가 있으려면 주의 깊게 중간을 가늠하여 자기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남북관계를 남북 양측의 의도의 조합으로 보면 협력으로 갈 가능성은 1/4이다. 판문점 공동선언을 어떻게 규정하든, 이제 남북은 서로를 비방하는 일을 다시 일삼기 시작했다. 합의를 준수하고, 상대로부터의 기대가 미흡할 경우 인내하거나 소통을 전개하는 노력이 자기를 제어하는 것일까. 불신과 대결이 다시 고개를 쳐드는 작금의 시점에서 중간상태에 대한 평화적 관리보다는 상태로써의 전쟁이 행위로써의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일이 우선이다. ‘비겁하다’거나 ‘적과 내통한다’는 비난을 물리칠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서 보 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 보 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