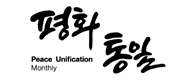베를린 장벽
베를린 장벽
우리고장 평화의 길
전쟁과 분단, 상흔 딛고 일어난 평화
베를린에서 그뤼네스 반트까지
매일 분단선을 넘는다. 장 보러 슈퍼 가는 길에, 산책하러 공원으로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장벽이 서 있던 분단선을 넘는다. 베를린은 그런 곳이다. 도시가 절반으로 나눠진 비극의 흔적을 이제는 일상 곳곳에서 추억으로 마주한다. 전쟁으로 파괴되고 전쟁 직후 분단되어 버린 비극의 도시. 베를린이 평화의 도시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베를린장벽기념공원
베를린장벽기념공원 * 사진 필자 제공
흔적이 된 도시의 장벽
8월 13일은 베를린장벽이 세워진 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장벽은 1961년 8월 13일 동독 정부가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경계를 폐쇄하면서 세워졌다. 서베를린을 둘러싼 길이만 182km에 이른다. 철조망으로 시작한 경계는 갈수록 높아지고 단단해지고 삼엄해졌다. 동독의 월요시위로 장벽이 붕괴되기까지 5,000여 명이 장벽을 넘어 탈출을 시도했고 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장벽이 서 있던 곳은 이제 기념공원이 되어 사람들을 반긴다. 베를린 노르트반호프(Nordbahnhof)역은 분단시절 ‘유령역’으로 불렸다. 장벽 경계와 닿아 있어 역 내는 물론 역 입구도 콘크리트벽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역 입구로 햇빛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드나든다.
노르트반호프를 나서면 한때 장벽이었던 철근이 바로 보인다. 베를린장벽의 일부를 그대로 보존한 베를린장벽기념공원(Gedenkstätte Berliner Mauer)은 동네 시민들의 쉼터이자 교육과 기억의 장소다. 경계를 넘다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가 곳곳에서 이뤄진다. 자유를 갈망하던 청년도, 경계 넘어 가족을 그리워했던 이들도, 경계를 지켜야 했던 군인들도 분단의 희생자였다.
“베를린장벽은 어느 쪽에서 세웠을까요?” 몇 년 전 한국에서 온 청소년들과 함께 이곳을 걸으며 던졌던 질문이다.
“서독이요! 그때 서독이 잘 살았잖아요.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기 싫어서 오지말라고 막았을 것 같아요.”
인상적인 오답이다. 한국 청소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다. 언제부터인가 통일 이야기에는 늘 비용 이야기가 따른다. 한국의 것을 얼마나 나눠주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길지 이야기한다. 그런 담론만 접한 아이들은 저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터. 이 길을 걷는 현장의 경험, 다양한 담론을 전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장벽이 서 있던 곳은 이제 기념공원이 되어 사람들을 반긴다. 베를린 노르트반호프(Nordbahnhof)역은 분단시절 ‘유령역’으로 불렸다. 장벽 경계와 닿아 있어 역 내는 물론 역 입구도 콘크리트벽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역 입구로 햇빛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드나든다.
노르트반호프를 나서면 한때 장벽이었던 철근이 바로 보인다. 베를린장벽의 일부를 그대로 보존한 베를린장벽기념공원(Gedenkstätte Berliner Mauer)은 동네 시민들의 쉼터이자 교육과 기억의 장소다. 경계를 넘다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가 곳곳에서 이뤄진다. 자유를 갈망하던 청년도, 경계 넘어 가족을 그리워했던 이들도, 경계를 지켜야 했던 군인들도 분단의 희생자였다.
“베를린장벽은 어느 쪽에서 세웠을까요?” 몇 년 전 한국에서 온 청소년들과 함께 이곳을 걸으며 던졌던 질문이다.
“서독이요! 그때 서독이 잘 살았잖아요.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기 싫어서 오지말라고 막았을 것 같아요.”
인상적인 오답이다. 한국 청소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다. 언제부터인가 통일 이야기에는 늘 비용 이야기가 따른다. 한국의 것을 얼마나 나눠주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길지 이야기한다. 그런 담론만 접한 아이들은 저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터. 이 길을 걷는 현장의 경험, 다양한 담론을 전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이스트사이드갤러리에 그려진 예술가들의 작품들
이스트사이드갤러리에 그려진 예술가들의 작품들 * 사진 필자 제공
자유와 예술의 상징 이스트사이드갤러리
베를린장벽기념공원을 지나 이스트사이드갤러리(East Side Gallery)로 향한다. 베를린을 지나는 슈프레강을 따라 세워진 이 장벽 길은 기념공원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기념공원이 분단의 희생자를 기리며 차분하고 숙연한 분위기라면 이스트사이드갤러리는 자유분방한 베를린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베를린장벽이 붕괴되자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장벽을 모조리 없애려고 했다. 장벽 조각을 기념으로 챙긴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콘크리트가 공사장으로 사라졌다. 베를린장벽기념공원 측도 당시 무너진 장벽의 정확한 규모와 향방을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희열에 찬 베를린은 분단의 흔적을 보존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예술가들이 장벽에 그림을 그린 건 그래서다. 통일 이후 자유와 희망, 희열이 넘치는 베를린으로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다. 서독으로 빠져나간 동독의 빈자리를 전 세계 예술가들이 채웠다. 이들은 장벽을 보존하기 위해 뜻을 모았고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작품을 남겼다. 몇몇인상적인 그림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베를린 관광객의 필수코스가 된 이스트사이드갤러리는 날 좋은 주말이면 인파를 각오해야 한다.
베를린장벽길을 걷다 보면 눈에 띄는 게 있다. 주위에 새로 지은 건물이 많다는 것이다. 분단 시절 동독 정부는 장벽과 인접한 건물을 모두 비우고 일부는 헐어냈다. 경계(境界)를 비워 경계(警戒)를 쉽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통일 후에도 한참 동안 버려져 있다가 최근 몇 년간 새 건물이 많이 들어섰다. 베를린장벽길을 따라 도시의 변화와 발전상도 가늠해볼 수 있다.
베를린장벽이 붕괴되자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장벽을 모조리 없애려고 했다. 장벽 조각을 기념으로 챙긴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콘크리트가 공사장으로 사라졌다. 베를린장벽기념공원 측도 당시 무너진 장벽의 정확한 규모와 향방을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희열에 찬 베를린은 분단의 흔적을 보존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예술가들이 장벽에 그림을 그린 건 그래서다. 통일 이후 자유와 희망, 희열이 넘치는 베를린으로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다. 서독으로 빠져나간 동독의 빈자리를 전 세계 예술가들이 채웠다. 이들은 장벽을 보존하기 위해 뜻을 모았고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작품을 남겼다. 몇몇인상적인 그림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베를린 관광객의 필수코스가 된 이스트사이드갤러리는 날 좋은 주말이면 인파를 각오해야 한다.
베를린장벽길을 걷다 보면 눈에 띄는 게 있다. 주위에 새로 지은 건물이 많다는 것이다. 분단 시절 동독 정부는 장벽과 인접한 건물을 모두 비우고 일부는 헐어냈다. 경계(境界)를 비워 경계(警戒)를 쉽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통일 후에도 한참 동안 버려져 있다가 최근 몇 년간 새 건물이 많이 들어섰다. 베를린장벽길을 따라 도시의 변화와 발전상도 가늠해볼 수 있다.
 1949년 뫼들러로이트. 실개천을 사이에 두고 경계 표시가 되어 있었다. ⓒBundesarchiv
1949년 뫼들러로이트. 실개천을 사이에 두고 경계 표시가 되어 있었다. ⓒBundesarchiv * 사진 필자 제공
동서독의 경계 그뤼네스 반트
호텔 ‘리 메이커’는 작은 미술관이기도 하다. 아트룸 외에도 공용 공간마다 장르를 넘나드는 미술작품들이 들어차 있다. 그중에서도 호텔 로비에 자리 잡은 김종량 작가의 <신(新) 몽유도원도-나전>은 10미터에 달하는 거대함 속에 디스토피아적 현실과 그 너머에 존재하는 유토피아적 이상향이 대비를 이루는 걸작이다. 조선시대 화가인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나전으로 재구성했는데 제작기간만 4년이 걸렸다.
이 밖에도 인간 내면과 실제의 풍경을 그로테스크하게 풀어낸 김나리 작가의 조각, 고성의 바람을 특유의 조형으로 치환한 해련 작가의 회화, 자연 생태적이면서도 몽환적 여운이 물씬한 전경선의 부조, 평화를 싣고 내달리는 바람을 무형의 이미지로 다룬 육효진 작가의 사운드 아트 등도 만날 수 있다. 모두 분단의 역사와 자유, 평화, 생태, 미래를 키워드로 한 작품들이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단어임에도 19명의 예술가들은 변별력 있는 개성과 독창성 아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희망’을 새겨 넣었다는 게 공통점이다.
이 밖에도 인간 내면과 실제의 풍경을 그로테스크하게 풀어낸 김나리 작가의 조각, 고성의 바람을 특유의 조형으로 치환한 해련 작가의 회화, 자연 생태적이면서도 몽환적 여운이 물씬한 전경선의 부조, 평화를 싣고 내달리는 바람을 무형의 이미지로 다룬 육효진 작가의 사운드 아트 등도 만날 수 있다. 모두 분단의 역사와 자유, 평화, 생태, 미래를 키워드로 한 작품들이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단어임에도 19명의 예술가들은 변별력 있는 개성과 독창성 아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희망’을 새겨 넣었다는 게 공통점이다.
 분단의 흔적이 남아 있는 작은 마을 뫼들러로이트
분단의 흔적이 남아 있는 작은 마을 뫼들러로이트 * 사진 필자 제공
작은 베를린, 뫼들러로이트
체코 국경과 인접한 곳에 인구 40명의 ‘작은 베를린’ 뫼들러로이트(Mödlareuth)가 있다. 이 작은 마을은 분단된 후 폭이 1미터도 되지 않는 실개천을 경계로 마을이 갈라져 독일 전역에 유명해졌다. 분단 이전에도 실개천을 중심으로 튀링엔주, 바이에른주로 나뉘어 있었지만 한 나라이기에 문제는 없었다. 실개천을 넘어 이웃과 만나고 할머니집을 방문하고 학교에 다녔다.
동서독이 분단되자 실개천을 사이에 두고 경계를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졌다. 1952년 3월 26일 동독은 밤사이 국경을 차단했고, 1966년 이곳에도 장벽이 높이 세워졌다. 그렇게 마을 주민들은 30년 가까이 장벽을 사이에 두고 살아야 했다. 사람들은 뫼들러로이트를 ‘작은 베를린’이라 부른다. 도시가 쪼개진 베를린처럼 분단의 비극이 이 작은 마을에까지 찾아왔다.
비극의 역사만큼 지금의 평화가 빛난다. 독일 베를린과 그뤼네스 반트는 그래서 한반도에 작은 희망을 준다. 독일은 통일 이후 숱한 진통을 겪었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경계를 걷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통일은, 아니 평화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동서독이 분단되자 실개천을 사이에 두고 경계를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졌다. 1952년 3월 26일 동독은 밤사이 국경을 차단했고, 1966년 이곳에도 장벽이 높이 세워졌다. 그렇게 마을 주민들은 30년 가까이 장벽을 사이에 두고 살아야 했다. 사람들은 뫼들러로이트를 ‘작은 베를린’이라 부른다. 도시가 쪼개진 베를린처럼 분단의 비극이 이 작은 마을에까지 찾아왔다.
비극의 역사만큼 지금의 평화가 빛난다. 독일 베를린과 그뤼네스 반트는 그래서 한반도에 작은 희망을 준다. 독일은 통일 이후 숱한 진통을 겪었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경계를 걷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통일은, 아니 평화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유진
프리랜서 기자
이유진
프리랜서 기자자문위원(북유럽협의회 베를린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