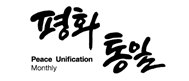통일칼럼
접경지역에 봄이 와야 한반도에도 봄이 온다
30여 년 전, 지구 반대쪽에서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졌다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서냉전의 닫힌 문도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제 브란덴부르크는 세계적 관광 명소가 되었다. 봉쇄됐던 시절을 회고하는 비석이나 전시물에는 장벽에 가로막혀, 또는 장벽을 넘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새로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반도의 장벽 외에도 미국, 이스라엘과 서안지구, 유럽 각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 갈등과 분쟁 지역을 넘나들면서 취재해 온팀 마샬(Tim Marshall) 기자는 21세기 들어 한반도를 포함한 65개 국민국가에 세워진 장벽의 길이만 수천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에 앞장섰던 사람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임은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어릴 적 교과서에서 읽었던 ‘거인의 정원’이 간혹 떠오 른다. 욕심 많은 거인은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장벽을 높이 쌓아 올렸다. 그런데 장벽을 쌓아 올린 이후 정원은 꽃도 피지 않고, 새도 노래하지 않는 겨울의 정원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아이들이 거인의 정원에 와서 놀 수 있게 되었고, 그러자 다시 꽃도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봄이 왔다는 줄거리다. 안전과 행복을 위해 벽을 높이 쌓았지만, 오히려 벽이 낮아지고 문이 열릴때 안전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아직 한반도는 겨울이다. 한반도의 정원이라 할 비무장 지대는 멧돼지, 살쾡이들이 살고 있는 새로운 생태공동 체이지만 비무장이라는 말과는 정반대로 엄청난 중화 기로 무장되어왔다.
나는 겨울 방학이면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마을을 조사 하곤 했다. 한국전쟁 후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면서 그곳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던 산골’이 아닌 불안과 공포의 공간이 되었다.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이 멱을 감던 임진강은 그림의 떡처럼 변했다. 강화 교동면 사람 들은 일제강점기만 해도 장날에 바다를 건너 연백군이나 개성으로 장을 보러 가거나 유학을 가곤 했다. 그 기억은 한국전쟁 이후 ‘침묵’으로 바뀌었다. 연백이나 개성으로 건너간 사람은 자원적 월북자로 간주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빨갱이 집안’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거나 부역자로 고생하는 일이 허다했다
2000년 전후로 남북관계가 호전되었으나 접경지대 사람들의 행복한 단꿈은 잠시였고, 또 다른 광경을 목격해야 했다. 부자들이 모여들면서 헛바람만 들어 패가망신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온갖 기구들을 싣고 온 사람 들이 확성기를 틀고 북녘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대북 전단지를 쏘아 올렸다. 이에 북측이 고사총 사격으로 응수할 때면, 접경지대 인근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곤 했다
요한 갈퉁(Johan Galtung)의 표현에 따르면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때, 그자유는 ‘폭력’일 뿐이다. 접경지역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을 온전히 존중받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가 평화의 정원이 되고, 생명공동체로 바뀌며, 분단의 철책이 꽃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새로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반도의 장벽 외에도 미국, 이스라엘과 서안지구, 유럽 각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 갈등과 분쟁 지역을 넘나들면서 취재해 온팀 마샬(Tim Marshall) 기자는 21세기 들어 한반도를 포함한 65개 국민국가에 세워진 장벽의 길이만 수천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에 앞장섰던 사람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임은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어릴 적 교과서에서 읽었던 ‘거인의 정원’이 간혹 떠오 른다. 욕심 많은 거인은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장벽을 높이 쌓아 올렸다. 그런데 장벽을 쌓아 올린 이후 정원은 꽃도 피지 않고, 새도 노래하지 않는 겨울의 정원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아이들이 거인의 정원에 와서 놀 수 있게 되었고, 그러자 다시 꽃도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봄이 왔다는 줄거리다. 안전과 행복을 위해 벽을 높이 쌓았지만, 오히려 벽이 낮아지고 문이 열릴때 안전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아직 한반도는 겨울이다. 한반도의 정원이라 할 비무장 지대는 멧돼지, 살쾡이들이 살고 있는 새로운 생태공동 체이지만 비무장이라는 말과는 정반대로 엄청난 중화 기로 무장되어왔다.
나는 겨울 방학이면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마을을 조사 하곤 했다. 한국전쟁 후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면서 그곳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던 산골’이 아닌 불안과 공포의 공간이 되었다.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이 멱을 감던 임진강은 그림의 떡처럼 변했다. 강화 교동면 사람 들은 일제강점기만 해도 장날에 바다를 건너 연백군이나 개성으로 장을 보러 가거나 유학을 가곤 했다. 그 기억은 한국전쟁 이후 ‘침묵’으로 바뀌었다. 연백이나 개성으로 건너간 사람은 자원적 월북자로 간주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빨갱이 집안’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거나 부역자로 고생하는 일이 허다했다
2000년 전후로 남북관계가 호전되었으나 접경지대 사람들의 행복한 단꿈은 잠시였고, 또 다른 광경을 목격해야 했다. 부자들이 모여들면서 헛바람만 들어 패가망신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온갖 기구들을 싣고 온 사람 들이 확성기를 틀고 북녘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대북 전단지를 쏘아 올렸다. 이에 북측이 고사총 사격으로 응수할 때면, 접경지대 인근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곤 했다
요한 갈퉁(Johan Galtung)의 표현에 따르면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때, 그자유는 ‘폭력’일 뿐이다. 접경지역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을 온전히 존중받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가 평화의 정원이 되고, 생명공동체로 바뀌며, 분단의 철책이 꽃으로 바뀌어야 한다.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