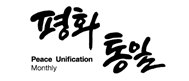청자기 현장르포
독일 통일 30주년
어느 날의 소소한 산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움츠러들었던 2020년이 독일 만큼 아쉬운 나라도 없을 것이다. 올해 통일 30주년을 맞은 독일에서는 분단과 통일의 과정을 조명하는 각종 행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취소되고 말았다. 비록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30년 전 이맘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포옹이 있었던 독일의 공간들을 지면으로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달려라, 트라비(Trabi)!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순간은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중계됐다. 장벽을 깨부수던 망치와 정, 장벽을 끌어내리던 굵은 밧줄, 장벽 잔해를 넘으려고 저쪽 사람들에게 내민 이쪽 사람들의 손, 얼싸안은 이들의 함박웃 음…. 장벽 위에 올라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포효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브라운관 앞에 앉은 우리의 눈가를 촉촉히 적셨다.
 베를린 장벽
베를린 장벽
당시 경적소리를 내며 검문소를 줄이어 통과하던 자동차 행렬도 이어졌다.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줄줄이 넘어온 자동차들이다. 서쪽 사람들은 탈탈거리며 검문소를 넘는 작고 귀여운 트라비를 보며 ‘정말 통일이 되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 근처에는 여전히 트라비 를 이용한 관광상품이 많다.
통일 이후 트라비는 안전 문제, 환경 문제 등으로 생산이 중단 됐으나 통일 20주년을 맞아 단점을 보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뉴-트라비’로 재탄생했다. 뉴-트라비는 2010년 프랑크 푸르트 국제모터쇼에서 선보였는데, 통일 20주년에 구동독의 국민 자동차가 구서독에서 열린 자동차박람회에 등장한 사연은 신기술에 대한 감탄보다 훨씬 더 묵직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 분단의 아픔을 보완해 통일의 상징물로 만들어낸 것 같은 뉴-트라비의 등장에 가슴이 짠했던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으리라.
통일 이후 트라비는 안전 문제, 환경 문제 등으로 생산이 중단 됐으나 통일 20주년을 맞아 단점을 보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뉴-트라비’로 재탄생했다. 뉴-트라비는 2010년 프랑크 푸르트 국제모터쇼에서 선보였는데, 통일 20주년에 구동독의 국민 자동차가 구서독에서 열린 자동차박람회에 등장한 사연은 신기술에 대한 감탄보다 훨씬 더 묵직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 분단의 아픔을 보완해 통일의 상징물로 만들어낸 것 같은 뉴-트라비의 등장에 가슴이 짠했던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으리라.
이 또한 아픈 분단 ‘눈물의 궁전’
독일은 분단 중에도 통행증을 받아 상호 방문이 가능했고, 편지와 소포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가시 돋친 한반도의 분단보다 나아보이지만, 그럼에도 독일 역시 분단에 가슴 아파했다
‘눈물의 궁전(Tränenpalast)’은 동-서베를린의 경계가 맞닿은 곳에 세워졌다. 분단 시기 여행 허가증을 발급받은 가족과 친구가 이곳에서 마중하고 배웅하며 흘리던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는 설명을 부연하지 않아도 이 이름에 담긴 사연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눈물의 궁전(Tränenpalast)’은 동-서베를린의 경계가 맞닿은 곳에 세워졌다. 분단 시기 여행 허가증을 발급받은 가족과 친구가 이곳에서 마중하고 배웅하며 흘리던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는 설명을 부연하지 않아도 이 이름에 담긴 사연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눈물의 궁전’에 전시돼 있는 동베를린으로 가는 편지와 소포
‘눈물의 궁전’에 전시돼 있는 동베를린으로 가는 편지와 소포
당시 허가증을 심사할 때 키와 얼굴만 대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귀 모양, 이마 모양, 눈동자 색 등을 매우 까다롭게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동베를린에 다녀왔던 서독 사람들은 까다로운 심사대에서 가슴을 졸이기도 하고, 동베를린에서 우연히 만난 오랜 친구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조금이라도 더 머물기 위해 손목시계를 계속 들여다보기도 했다고 한다.
눈물의 궁전 관람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여러 나라의 언어로 ‘기억(Erinnerung)’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언젠가 이곳을 방문할 북녘의 동포들이 한국어로 쓰인 ‘기 억’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와 같은 발음을 되뇌며 같은 다짐을 새길 수 있기를 바라본다.
눈물의 궁전 관람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여러 나라의 언어로 ‘기억(Erinnerung)’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언젠가 이곳을 방문할 북녘의 동포들이 한국어로 쓰인 ‘기 억’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와 같은 발음을 되뇌며 같은 다짐을 새길 수 있기를 바라본다.
이웃이 다시 만나 예배드리는 평범한 일상
베를린 동-서의 경계는 주로 강과 숲으로 이루어졌지만 장벽은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기도 한다. 그 때문에 길 하나 건너에 살던 가족과 이웃이 갑작스레 헤어지기도 했다. 동쪽 벽과 서쪽 벽 사이에 놓였던 한 교회는 장벽보다 높아 경비 근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1985년 결국 사라지게 됐다.
 서베를린을 3일간 여행할 수 있는 통행증
서베를린을 3일간 여행할 수 있는 통행증
그러나 독일 통일 5년 후, 교회가 사라진 자리에 예배당이 세워졌다. 이름은 ‘화해의 예배당(Kapelle der Versöhnung)’. 동서에 나뉘어 살던 독일인들이 다시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볼 수 있게된 것. 말하자면 원래 이웃이었던 이들이 다시 이웃이 된 것이 다. 남과 북의 이웃은 언제쯤 다시 만나 ‘화해의 예배당’을 세울 수 있을까.
“그는 자유를 원했을 뿐이다” - 페터 페히터를 추모하며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아 마지막으로 소개할 공간은 한 청년의 추모비다. 독일 분단 초기인 1962년, 열여덟 살의 동베를린 청년 페터 페히터(Peter Fechter)는 친구와 함께 장벽을 넘기로 한다. 하지만 먼저 장벽을 넘은 친구와 달리, 페히터는 동쪽 경비병이 쏜 총에 맞아 장벽과 장벽 사이에 떨어지고 말았다.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과다출혈로 사망한 페히터에 대해 서쪽에서는 방송 중계만 했고, 동쪽에서는 그의 시신 만을 거둬갔을 뿐이었다. 이 사건은 세상의 공분을 자아냈고, 동-서독 모두 비인간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화해의 예배당 근처에 있는 화해의 조각상
화해의 예배당 근처에 있는 화해의 조각상
그가 누웠던 자리에는 이제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베를린장 벽이 지났던 자리를 표시한 돌 블록 위에 세워진 그의 추모비 에는 항상 꽃과 초가 놓여 있다. 그때 목숨을 잃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일흔여덟의 노인이 됐을 열여덟 청년의 싱그러운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통일 30주년이 지났지만, 독일 사람들은 여전히 동서의 격차와 갈등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독일이 철저하게 전쟁의 과오를 사죄하는 자세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잊지 않는다면 현재의 갈등도 차차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도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 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통일 30주년이 지났지만, 독일 사람들은 여전히 동서의 격차와 갈등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독일이 철저하게 전쟁의 과오를 사죄하는 자세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잊지 않는다면 현재의 갈등도 차차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도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 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정은비
청년 자문위원 기자 (북유럽협의회)
청년 자문위원 기자 (북유럽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