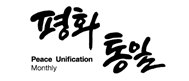평화 사랑채
일상의 분단 사유하기
탈분단 평화교육의 시작
한국 사회가 현재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오랜 분단은 무거운 숙제로 존재해왔다. 당위로서 주어진 ‘통일’이라는 과제와 꽉 막힌 분단 상황 사이에서 전쟁의 고통과 이산의 아픔을 가진 개개인의 목소리는 삭제되고 잊혀 갔다. 평화에 대한 상상은 ‘적’이라는 존재를 넘기 힘들었고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선함을 언제나 강조하고 가르쳤지만 정작 그 평화가 어떤 과정이고 모습인지 이야기를 나누거나 배울 기회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한국 사회에서 평화가 무엇인지 묻는 것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진다.
평화를 바라보는 ‘잘못된’ 방식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타이완으로 이주했던 한 수녀님으로부터 들은 일화다. 의사였던 아버지는 어느 날 복부에 총상을 입은 공산당 소년병을 치료해주었다. 당시 소녀였던 수녀님은 아버지께 “공산당 뱃속의 살이 새까만 색이었나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타이완만의 특수한 경험일까? 누군가를 적으로 간주하는 악마화(Demonization)를 일상화한 한국 사회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빨갱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고통의 역사를 생각해보라. 악마화를 통한 각종 군사안보 교육은 분단 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심적 토대와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왔다.
북한에 대한 시선은 어떠한가? 국방백서뿐만 아니라 정훈교육과 반공 포스터, 관변 만화책과 휴전선 안보 관광 등을 통해 한국 사회는 오랜 시간 북한을 적으로 규정해왔다. 이러한 사회적 메시지는 거의 항상 주류 ‘이데올로기’가 되어 한반도의 분단과 폭력을 지속시켰다. 안보를 공동의 목적으로 설정한 국가 주도의 공교육은 공공의 적을 만들고, 그 적과 비슷한 존재들을 색출하여 타자화했다. ‘나 또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그들’을 ‘우리’로부터 분리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만큼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까지도 예외로 인정해왔다.
브라질의 교육자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는 교육을 은행저금식 교육(Banking Concept Education)과 문제 제기식 교육(Problem Posing Education)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은행저금식 교육관은 인간을 관리 가능한 존재로 간주하여 학생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수동적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수록 교육의 목표에 도달하고, 이를 더 완벽하게 수행하는 학생일수록 훌륭한 학생으로 평가한다. 반면, 문제제기식 교육은 사람을 ‘변화의 과정에 있는 존재’로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성되어가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미완성의 존재이며 새롭게 구성되고 변화하는 현실에 조응하고 반응하며 변화해가는 존재로 바라본다.
타이완만의 특수한 경험일까? 누군가를 적으로 간주하는 악마화(Demonization)를 일상화한 한국 사회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빨갱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고통의 역사를 생각해보라. 악마화를 통한 각종 군사안보 교육은 분단 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심적 토대와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왔다.
북한에 대한 시선은 어떠한가? 국방백서뿐만 아니라 정훈교육과 반공 포스터, 관변 만화책과 휴전선 안보 관광 등을 통해 한국 사회는 오랜 시간 북한을 적으로 규정해왔다. 이러한 사회적 메시지는 거의 항상 주류 ‘이데올로기’가 되어 한반도의 분단과 폭력을 지속시켰다. 안보를 공동의 목적으로 설정한 국가 주도의 공교육은 공공의 적을 만들고, 그 적과 비슷한 존재들을 색출하여 타자화했다. ‘나 또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그들’을 ‘우리’로부터 분리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만큼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까지도 예외로 인정해왔다.
브라질의 교육자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는 교육을 은행저금식 교육(Banking Concept Education)과 문제 제기식 교육(Problem Posing Education)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은행저금식 교육관은 인간을 관리 가능한 존재로 간주하여 학생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수동적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수록 교육의 목표에 도달하고, 이를 더 완벽하게 수행하는 학생일수록 훌륭한 학생으로 평가한다. 반면, 문제제기식 교육은 사람을 ‘변화의 과정에 있는 존재’로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성되어가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미완성의 존재이며 새롭게 구성되고 변화하는 현실에 조응하고 반응하며 변화해가는 존재로 바라본다.

분단을 극복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남북관계를 대결 구도로 해석해왔던 안보 교육은 극대화된 은행저금식 교육의 전형이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분단은 축적되어 온 것이며 과거 정부들이 취했던 선택의 총합이자 당시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에 맞춰 행동해온, 수행된(Performed) 분단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수행된 분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평화교육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평화교육의 핵심
나의 얼굴에서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우리 사회에 필요한 평화교육
첫째, 평화교육은 폭력을 깊이 사유함으로써 폭력의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일상의 사소한 듯 보이는 폭력들이 실상 한반도가 겪어온 뿌리 깊은 분단 폭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드러내고, 그 폭력의 구조를 해체하며 그 구조 속에 놓인 개인의 삶을 바꾸어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둘째, 평화교육은 “평화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음껏 상상해볼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평화를 지향하는 시민으로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평화를 가치의 중심에 두고 자신의 결정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차이와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다루며 정치적인 존재로서 각자의 자기결정들을 어떻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확장 할 수 있는지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셋째, 평화교육은 나의 얼굴에서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평화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되 ‘나만의 문제’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되 그 ‘우리’를 너무 쉽게 확정하지 않는 것, ‘우리’라는 단어에 포섭되는 것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우리’를 선별해내려는 그물을 찢는 것, 이것이 평화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최근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학생의 입학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사회적 논쟁 역시 이 지점에 깊숙이 닿아 있다. 안보의 세계관은 사람의 얼굴을 지움으로써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우리’를 형성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그리고 이 ‘배타적인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동해왔다. 따라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전환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배제와 혐오의 장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2020년 봄, 분단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질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대체 누구이며 누가 ‘우리’를 규정하는가? ‘우리’가 꿈꾸는 평화는 무엇이며 그 평화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는 누구인가?
둘째, 평화교육은 “평화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음껏 상상해볼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평화를 지향하는 시민으로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평화를 가치의 중심에 두고 자신의 결정을 시뮬레이션해보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차이와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다루며 정치적인 존재로서 각자의 자기결정들을 어떻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확장 할 수 있는지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셋째, 평화교육은 나의 얼굴에서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평화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되 ‘나만의 문제’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되 그 ‘우리’를 너무 쉽게 확정하지 않는 것, ‘우리’라는 단어에 포섭되는 것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우리’를 선별해내려는 그물을 찢는 것, 이것이 평화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최근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학생의 입학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사회적 논쟁 역시 이 지점에 깊숙이 닿아 있다. 안보의 세계관은 사람의 얼굴을 지움으로써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우리’를 형성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그리고 이 ‘배타적인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동해왔다. 따라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전환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배제와 혐오의 장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2020년 봄, 분단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질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대체 누구이며 누가 ‘우리’를 규정하는가? ‘우리’가 꿈꾸는 평화는 무엇이며 그 평화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는 누구인가?
평화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되 ‘나만의 문제’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되 그 ‘우리’를 너무 쉽게 확정하지 않는 것,
‘우리’라는 단어에 포섭되는 것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우리’를 선별해내려는 그물을 찢는 것,
이것이 평화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문 아 영
피스모모 대표, 평화교육 진행자
문 아 영
피스모모 대표, 평화교육 진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