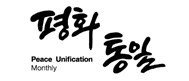금강산 마지막 봉인 구선봉과 해금강의 전경 ⓒ고성군청
금강산 마지막 봉인 구선봉과 해금강의 전경 ⓒ고성군청
접경지역 사람들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희망을 안고 사는
고성 사람들
세계 유일의 분단 군(郡)
삼국시대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였던 강원도 고성군은 현재 남북의 접경지이자 우리나라 최북단지역이 됐다. 강원도 고성군은 삼국시대 이래 고성 지방과 간성 지방이 분리와 통합을 거듭해왔다. 고구려 때는 고성과 간성을 ‘달홀(達忽)’과 ‘가라홀(加羅忽, 가아홀)’이라 각각 불렀고 고려 성종 때 부군현제(府郡縣制)가 시행되면서 ‘간성(杆城)’이라 불렀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4년 ‘고성군’이 ‘간성군’에 병합됐다가 1919년 ‘간성군’을 ‘고성군’으로 고쳐 부르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 고성군과 접하고 있는 강원도 고성군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남과 북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고성군은 남북으로 두 동강 난 채 70년 가까이 지내왔다. 38도선 이북에 위치한 고성군은 얄궂게도 북한의 통치를 받게 됐다. 1954년 수복 이후 고성 사람들은 인민군부역자로 낙인찍힐까 전전긍긍하며 더 극렬한 반공주의자로 살아남아야 했다.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한국 현대사의 슬픈 자화상이다.
북진하는 국군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던 실향민과 피란민들은 1953년 휴전이 성사되자 보따리를 풀어 놓고 하루하루 고향 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눈에 닿아 더 아픈 고향 땅을 한 발짝도 밟지 못하고 이승을 떠나거나 생이별의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다. 그들은 접경지역의 아픔을 안은 채 통일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 고성군과 접하고 있는 강원도 고성군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남과 북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고성군은 남북으로 두 동강 난 채 70년 가까이 지내왔다. 38도선 이북에 위치한 고성군은 얄궂게도 북한의 통치를 받게 됐다. 1954년 수복 이후 고성 사람들은 인민군부역자로 낙인찍힐까 전전긍긍하며 더 극렬한 반공주의자로 살아남아야 했다.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한국 현대사의 슬픈 자화상이다.
북진하는 국군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던 실향민과 피란민들은 1953년 휴전이 성사되자 보따리를 풀어 놓고 하루하루 고향 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눈에 닿아 더 아픈 고향 땅을 한 발짝도 밟지 못하고 이승을 떠나거나 생이별의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다. 그들은 접경지역의 아픔을 안은 채 통일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닿을 수 없는 고향을 눈 끝에 담다’ 고성 통일전망대
전방엔 길이 없다. 가던 길도 모두 닫혀 있다. 길의 끝자락에서 눈 끝에 닿아 더 슬픈 곳. 사람들은 넘어지면 코 닿을 데라고도 한다. 그만큼 북녘 땅이 가까운 곳이다.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동토의 땅은 건널 수 없는 천 길 벼랑 끝이다. 언제쯤 그 길을 걸어서 갈 수 있을까.
해발 70m 고지에 위치한 통일전망대는 먼발치에서나마 고향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1984년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남북으로 이어진 아름답고 긴 해안선을 따라 북녘 땅을 바라볼 수 있고 명산 금강산의 산세를 파노라마처럼 감상할 수 있다. 금강산 마지막 봉인 구선봉, 거울같이 맑은 호수 감호, 말 무리반도와 해금강 등 아름다운 북고성 절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명소다. 북고성 송현리, 초구리, 대강리 등 그리운 고향마을과 녹슨 군사분계선, 수풀이 우거진 비무장지대를 바라보며 분단의 현실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실향민들은 이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북녘의 가족을 그리워하며 눈물짓다가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리곤 한다. 최근에는 이곳에 통일전망대 타워가 새로 만들어져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북녘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전망대 옆에는 북고성 실향민들을 위한 망배단이 자리하고 있다. 본래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에 있던 망배단이었는데 주민들의 이전 요구에 따라 2020년 고향 땅이 건너다보이는 현재의 장소로 옮겨졌다.
“갑세” 가자고 하는데 더 이상 갈 수 없다. 철길, 신작로, 샛길, 오솔길은 그림 도려내듯 싹둑 잘렸고 산천은 막다른 길이 된 지 오래다. “이 보우야, 이 봅세, 날래 갑세, 가젱이야” 무덤으로 떠나버린 옆집 아바이, 어마이 그 정겨운 목소리가 듣고 싶다.
해발 70m 고지에 위치한 통일전망대는 먼발치에서나마 고향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1984년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남북으로 이어진 아름답고 긴 해안선을 따라 북녘 땅을 바라볼 수 있고 명산 금강산의 산세를 파노라마처럼 감상할 수 있다. 금강산 마지막 봉인 구선봉, 거울같이 맑은 호수 감호, 말 무리반도와 해금강 등 아름다운 북고성 절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명소다. 북고성 송현리, 초구리, 대강리 등 그리운 고향마을과 녹슨 군사분계선, 수풀이 우거진 비무장지대를 바라보며 분단의 현실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실향민들은 이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북녘의 가족을 그리워하며 눈물짓다가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리곤 한다. 최근에는 이곳에 통일전망대 타워가 새로 만들어져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북녘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전망대 옆에는 북고성 실향민들을 위한 망배단이 자리하고 있다. 본래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에 있던 망배단이었는데 주민들의 이전 요구에 따라 2020년 고향 땅이 건너다보이는 현재의 장소로 옮겨졌다.
“갑세” 가자고 하는데 더 이상 갈 수 없다. 철길, 신작로, 샛길, 오솔길은 그림 도려내듯 싹둑 잘렸고 산천은 막다른 길이 된 지 오래다. “이 보우야, 이 봅세, 날래 갑세, 가젱이야” 무덤으로 떠나버린 옆집 아바이, 어마이 그 정겨운 목소리가 듣고 싶다.
 명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실향민들이 제사를 지내는 망배단 ⓒ고성군청
 분단의 현실을 느낄 수 있는
분단의 현실을 느낄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고성 코스 ⓒ고성군청
‘철마(鐵馬)는 달리고 싶다’ 제진역사(猪津驛舍)
제진역사(猪津驛舍)의 철마는 남북으로 이어진 철길을 따라 다시 오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동해북부선 철도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 흡곡-양양 구간이 단계별로 개통됐다. 아름다운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철도는 1943년 운행이 중단됐고 6·25 전쟁 이후에 완전히 멈췄다. ‘양양역~초구역’ 구간이 전쟁으로 초토화됐기 때문이다. 시간이 멈춘 철마는 한여름에도 춥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남북출입사무소가 설치되면서 2006년 제진역과 철길이 완공됐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7년 5월이 돼서야 경의선과 함께 북한 감호역까지 남북 열차 시험 운행이 이루어졌다.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2003년 금강산 육로관광이 개통됐고 끊어진 동해북부선도 60여 년 긴 잠에서 깨어나 그 철길이 다시 이어졌다. 큰 기대를 모았지만 2008년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되면서 철도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당시 시험 운행을 했던 열차는 약 2년 정도 제진역에 머무르다가 2008년 6월에 묵호항으로 끌려갔다. 그 후 2020년 9월 폐차된 철마는 다시 제진역사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태 전 제진역과 강릉역을 잇는 철도 공사가 가시화된다는 소식에 잠시나마 마음이 설렜는데 그것도 잠시, 다시 오리무중이다. 이 철길이 완공되면 제진역은 남북 경협의 물류 중심기지이자 유라시아의 관문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 동해북부선 철길을 따라 원산–나진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 전영수 고성군 이장단협의회장(65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남북출입사무소가 설치되면서 2006년 제진역과 철길이 완공됐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7년 5월이 돼서야 경의선과 함께 북한 감호역까지 남북 열차 시험 운행이 이루어졌다.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2003년 금강산 육로관광이 개통됐고 끊어진 동해북부선도 60여 년 긴 잠에서 깨어나 그 철길이 다시 이어졌다. 큰 기대를 모았지만 2008년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되면서 철도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당시 시험 운행을 했던 열차는 약 2년 정도 제진역에 머무르다가 2008년 6월에 묵호항으로 끌려갔다. 그 후 2020년 9월 폐차된 철마는 다시 제진역사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태 전 제진역과 강릉역을 잇는 철도 공사가 가시화된다는 소식에 잠시나마 마음이 설렜는데 그것도 잠시, 다시 오리무중이다. 이 철길이 완공되면 제진역은 남북 경협의 물류 중심기지이자 유라시아의 관문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 동해북부선 철길을 따라 원산–나진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 전영수 고성군 이장단협의회장(65세)
 내구 연한이 만료돼 2020년 다시 제진역에 유치된 무궁화호 폐객차 ⓒ고성군청
내구 연한이 만료돼 2020년 다시 제진역에 유치된 무궁화호 폐객차 ⓒ고성군청
‘육지 속 외딴섬’ 명파리
고성군 현내면에 위치한 명파리는 동해안 최북단 마을이다. 위도상으로 서쪽 끝은 북한의 사리원 북쪽 즈음이다. 금강산까지 직선거리로 20km 떨어진 명파 마을에는 150여 세대, 260여 명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이다. ‘동해의 맑은 물과 깨끗한 백사장이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명파 마을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소박함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 전까지만 해도 신분증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는 살벌한 민통선 마을이었다. 영농출입증이 없으면 꼼짝도 할 수 없고 더 북쪽으로 농사를 지으려다 자칫 간첩이나 거동 수상자로 오인당하기 십상이었다. 심지어 가까운 친척도 함부로 찾을 수 없는 엄격히 통제된 육지 속의 외딴섬이었다. 북한과 접경을 마주한 살 떨리는 전방이었던 이곳이 지금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마을이 됐다. 현재 통일전망대에 위치해 있던 군(軍) 검문소는 훗날 쑥고개 정상으로 옮겼다가 지금은 아예 마을 북쪽으로 옮겨갔다.
 금강산 관광 길목이었던 명파마을 거리의 상점들 ⓒ고성군청
금강산 관광 길목이었던 명파마을 거리의 상점들 ⓒ고성군청
대부분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시골 마을이었지만 통일전망대가 개관되며 탐방객이 늘어나자 도로변을 중심으로 삼삼오오 식당과 구멍가게가 문을 열었다. 특히 금강산 관광 길목이었던 명파리는 한 때 큰 호황을 누렸다. 당시 마을에는 관광버스가 끝도 없이 늘어섰고 민박집은 미어터졌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썰렁해졌다. 상점문도 대부분 굳게 닫혔다. 마을의 궂은일을 도맡아하는 이장 이종복(65세) 씨는 “7호선 국도가 외곽으로 옮겨가고 금강산 관광도 중단되면서 마을은 개점 휴업 상태로 생기를 잃었고 운영되던 식당과 가게마저 모두 문을 닫았다”고 하소연한다. 마을 주민들은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왔다. 접경지역의 슬픈 현실이 안타깝다.
“속절없이 흐른 세월이 너무 야속해요. 1세대는 대부분 돌아가셨고 2세대도 늙었는데, 하루빨리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 김영수 마을노인회장(79세)
“속절없이 흐른 세월이 너무 야속해요. 1세대는 대부분 돌아가셨고 2세대도 늙었는데, 하루빨리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 김영수 마을노인회장(79세)
‘파도와 시간이 아픔을 지워낼 수 있을까’ 최북단 대진항
대진항은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에 있는 최북단 항구다. 우리나라 지도를 세로로 접으면 백령도에서 북쪽으로 50km나 떨어진 황해남도 과일군이 대진항의 대칭점이 된다. 대범미진(大汎味津)이라 불리었던 이곳은 1910년 한일합병 이후 한나루(大津里)로 개칭됐다. 그 후 동해안을 따라 신작로가 개설됐고 1920년에 포구에 축항을 쌓으면서 조그마한 어항으로 자리 잡았다. 1935년 동해북부선 철도가 개통된 후로는 수산물을 원산 등지로 수송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됐다. 비록 작은 항구지만 등대와 방파제, 포구전망대 등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많은 탐방객이 찾는 곳이다. 비린내가 진동하는 포구엔 날마다 수산물을 사고파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북방파제 북쪽으로 봉긋 솟은 동산 위에는 최북단에 위치한 대진등대가 있다. 대진등대는 1973년에 처음 붉을 밝혔다. 등대에 올라서면 대진항이 한눈에 들어온다. 맑은 날에는 북녘 해금강과 금강산의 뾰족한 암봉까지 보일 정도로 풍경이 상쾌하다. 지금이야 대진에서 북쪽으로 마차진을 넘어 고깃배들이 넘나들지만 남북 갈등이 가장 첨예하던 시절에는 대진등대가 곧 북방 어로한계선의 기준이었다. 동해안의 거친 파도 속에서 묵묵히 이정표 역할을 감당해온 대진등대는 다른 등대와 달리 분단의 아픔과 애환을 머금고 있다. 등대에서 바라본 평화로운 어촌 풍경과 물 위를 오가는 철새들의 모습은 분단된 현실과 대비를 이루며 마음 한편을 저리게 한다.
사람들이 아프다. 아픈 상처는 아물기보다 곪을 대로 곪아 더 아프다. 비 그치면 날이 갠다고 했는데 언제쯤 날이 들까. 날 들면 눈부신 햇살에 그 깊은 상처를 오롯이 널어 말리고 싶다.
북방파제 북쪽으로 봉긋 솟은 동산 위에는 최북단에 위치한 대진등대가 있다. 대진등대는 1973년에 처음 붉을 밝혔다. 등대에 올라서면 대진항이 한눈에 들어온다. 맑은 날에는 북녘 해금강과 금강산의 뾰족한 암봉까지 보일 정도로 풍경이 상쾌하다. 지금이야 대진에서 북쪽으로 마차진을 넘어 고깃배들이 넘나들지만 남북 갈등이 가장 첨예하던 시절에는 대진등대가 곧 북방 어로한계선의 기준이었다. 동해안의 거친 파도 속에서 묵묵히 이정표 역할을 감당해온 대진등대는 다른 등대와 달리 분단의 아픔과 애환을 머금고 있다. 등대에서 바라본 평화로운 어촌 풍경과 물 위를 오가는 철새들의 모습은 분단된 현실과 대비를 이루며 마음 한편을 저리게 한다.
사람들이 아프다. 아픈 상처는 아물기보다 곪을 대로 곪아 더 아프다. 비 그치면 날이 갠다고 했는데 언제쯤 날이 들까. 날 들면 눈부신 햇살에 그 깊은 상처를 오롯이 널어 말리고 싶다.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국가어항인 대진항의 전경 ⓒ고성군청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국가어항인 대진항의 전경 ⓒ고성군청
 이 선 국
작가, 고성문화포럼 대표
이 선 국
작가, 고성문화포럼 대표